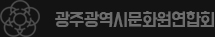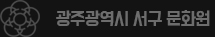이 고장 서창동 회산마을 출신 임란공신 회재 박광옥(朴光玉) 선생에게 대단히 영특한 따님이 한 분 있었는데 글은 사서삼경을 통달하고 짐승의 말소리까지를 알아듣는 신통한 재주를 지녔었다.
그녀 나이 과년(여자나이 15· 6세 때를 이름)이 되어 전북 남원의 명문인 노씨 가문에 출가를 했다.결혼 첫날밤에 신랑과 함께 자리에 누워 있다가 방구들에 숨어 있던 쥐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쥐들의 이야기는 부엌 밖의 식혜 항아리를 놓고 하는 것이었다. 한 쥐가 신혜 항아리에서 단맛이 난다며 항아리 속에 든 것을 먹고 싶은데 항아리가 미끄러워서 올라가지 못한다고 말하자, 다른 쥐가 항아리 밑의 흙을 파면 결국 항아리가 엎어질 것이고, 그 때 먹으면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쥐들의 이야기를 들은 새신부가 잠자리에서 웃은 것이 화근이 되어 시집에서 퇴박을 맞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필경 처녀시절에 정숙한 남자가 있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웃었다는 엉뚱한 트집이었다. 하기야 그때 당시의 풍습으로 갓 시집온 양가집 규수가 신혼 첫날밤 웃는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며 개화된 지금 세상이라도 조금은 말썽이 될 법한 일이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첫날 밤 이후로 친정으로 보내졌다. 남편과의 접촉도 일체 끊어진 상태여서 그 억울한 원왕을 씻을 길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간 뒤의 일이었다.
나뭇잎들이 짙은 초록빛으로 물든 초여름 어느 날, 시아버지 옥계(玉溪) 노진(盧禛:1518~1578) 공이 불쑥 이곳 사돈댁을 찾아왔다. 사돈 박회재 선생과는 전부터 친숙한 사이로 자식들 간의 불합은 그렇다 해도 옛 친구의 두터운 정리까지를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노공은 사돈댁에 오는 길 초의 어느 주막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집 툇마루에 떨어져있는 제비새끼 한 마리를 무심결에 도포 속에 넣고 왔다.
노공은 자부의 인사를 받고 차려 내온 술잔을 손에 들면서 사돈 박공에게 사과 겸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영조 임금께서는 아드님 장헌세자를 뒤주 속에 가뒀지만 우리야 어디?”(영조는 박광옥보다 150여년 뒤 인물이기 사실과 설화는 시기상 일치하지 않지만,
사돈 간의 정리를 복원하기 위해 든 일화로 해석하면 이해가 간다)하고 씁쓸한 얼굴로 말끝을 흐리는 것이었다.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아내를 퇴박한 아들을 탓하고 자신의 무위를 자책하는 말이기도 했다.
박공(朴公)은 그저 쓸쓸히 웃을 뿐 말이 없고 방안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하기만 했다. 그때였다. 다소곳이 꿇어앉아 술시중을 들고 있던 박부인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한 말투로 “아버님, 어서 약주 잔 드셔요. 그리고 그 아버님 도포 속에 제비새끼를 놓아주십시오. 어미가 저렇게 울고 보채고 있질 않습니까”하고 앞마당 빨래 줄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과연 거기에는 어미 제비 한 마리가 이쪽을 보고 슬픈 목소리로 재잘거리고 있었다. 노공은 조용히 일어서서 도포 속에 넣고 온 제비새끼를 꺼내어 마루바닥에 놓아주었다. 그러자 어미제비는 재빨리 그것을 입에 물고 날아갔다. 그래서 박부인에 대한 ‘혐의’는 완전히 풀리고 신원은 되었지만 시가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
그녀는 일생을 친정에서 지내면서 아버지를 도와 막대한 가산을 이루게 하고 그 재산으로 임진왜란때 많은 창의(倡義)를 돕는 등 큰 공훈을 세우게 했다. 그녀가 임종에 즈음하여 유언하기를 “나는 끝내 친정에서 생을 마치고 이곳에 묻히지만 시집 7대손이 이장을 해갈 것이니 그 때까지만 잘 부탁한다”하고 눈을 감았다. 과연 그 말이 적중하여 지금은 남원 땅 노씨 문중 선산에 묻혀있는데 사서는 물론 주역까지를 통달하여 만물을 지기하고 심지어 짐승의 말소리까지를 알아듣는 재능(才能)을 추앙하여 세칭 「주역 각시」라는 칭호로서 지금도 널리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